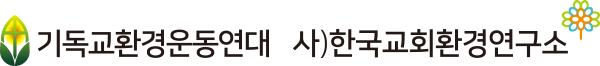녹색신앙 이야기
그래서 결국 답은 ‘사랑’이다
작성일
2023-05-16 15:26
조회
633

“우리가 사랑한 숲이에요”
거창한 구호나 당위가 아니라 그저 ‘사랑’이라고 했다. 삼나무 숲, 제주의 사람들에겐 봄철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소문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무들의 군락이었다. 심지어 자생종도 아닌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가져다 심은 나무였다. 하지만 그런 나무에게도 어떤 이는 베어진 밑동에 돌을 올려 슬픔을 표하기도 했고, 나뭇집을 지어 그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도 있었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숲속에 사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찾기 위해 숲 곳곳을 헤매는 이도 있었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용 대부분은 정보의 전달에 치중되어있다. 과학적 사실, 데이터가 전해주는 지구의 변화 시나리오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긴 하지만 사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우리가 사랑한 것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세상을 그려주지는 않는다.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1.5℃ 상승 폭도 지구에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을 극심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시나리오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상승 폭을 1.5℃로 막아내는 시나리오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 같은 것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더불어 거대한 위험 앞에서 생겨난 막막함은 가슴을 짓누른다.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은 소설가 김기창의 단편을 모아놓은 책이다. 세계관이 이어지는 연작 단편도 존재하고 아예 별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도 존재한다. 세 편의 연작 소설, ‘하이 피버 프로젝트’, ‘갈매기 그리고 유령과 함께한 하루’,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은 기후변화가 일어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을 배제하기 위해 인간이 택한 ’돔시티‘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일종의 공상과학소설처럼 느껴질 테지만 소설집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의 문제에 천착한다. 기후위기라고 불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 말이다.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른바 ‘생태 비탄’, 자연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 익숙했던 삶의 터전이 변해가거나 삶의 근간이 사라질 때 겪게 된다는 슬픔이 있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슬픔을 겪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안달할 필요도 없고, 애태울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대다수는 말한다. 안전이든 생명이든 그저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현실의 전기세, 가스비나 걱정하자고 말이다. 사는 일에 골몰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도 이야기한다. 탈핵이나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보통 말문을 막기 위해 쓰인다. 그리고 말문만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인간으로서 갖는 연대의 감정을 막곤 한다. 타인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팍팍한 제 삶이나 챙기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도 체르노빌도 남의 일이지만 결국 재난은 오염수 방류의 문제나 폭발 후 방사선 분진과 핵 구름으로 인류 모두의 문제가 되고 말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소설 속에서 더위와 추위,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난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돔시티는 차별과 배제를 통해 철저하게 내부와 외부를 가르고, 추방을 통해 통제와 질서를 만드는 곳이고,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입을 막음으로써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랑은 그런 통제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때론 가로막힌 장벽을 깨부수는 균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 답은 ‘사랑’이다. 어떤 이들에겐 조금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 탈핵신문 5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